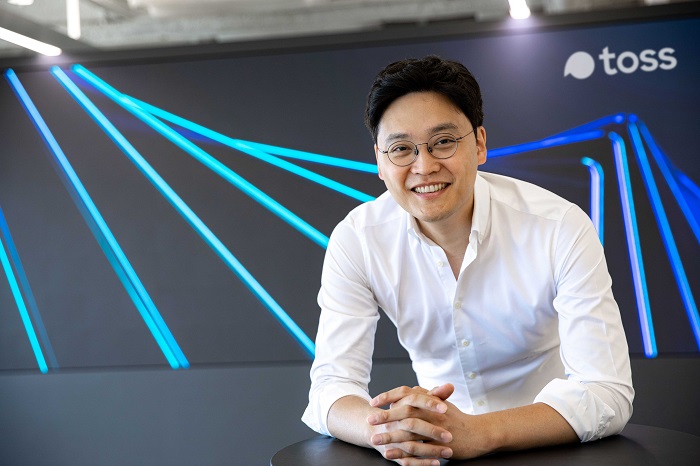토스가 미국 증시를 선택하겠다고 한 세가지 이유
핀테크 앱 토스를 서비스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가 국내가 아닌 미국 증시로 방향을 틀었다. 토스 측은 “미국상장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 시기 등은 미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안팎에서 추정하는 합리적인 배경은 ‘몸값(기업가치)’이다. 현재 토스의 기업가치는 약 1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토스가 지난 2022년 투자유치와 함께 받은 기업가치(약 8조5000억원)와 근접하다.
다수 언론과 증권사, 업계 등에선 토스가 제대로 된 기업가치를 받기 위해, 성장 잠재력을 더 후하게 쳐 주는 미국으로 향한다는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토스는 왜 국내보다 미국에서 기업가치를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해봤다.
한국, 토스에 대한 선입견
토스는 금융권에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지만 동시에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지난 2013년 출범 이후로 단 한 번도 연간흑자를 기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덩치는 키워왔으나 그만큼 손실도 커졌다. 올 상반기 토스의 매출액은 약 9141억원, 영업손실은 약 94억원이다.
그래도 최근에는 비용효율을 꾀하면서 영업손실 폭을 줄이고 있다. 올 상반기 토스의 영업손실은 91% 감소했다. 토스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연결기준 약 1조3707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약 2166억원으로 전년비 약 39% 줄었다.
이와 함께 토스의 수익모델(BM)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수수료, 광고 등이 주요 수익모델이지만, 이같은 수익모델로는 성장의 한계가 올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에 피어그룹이 없다
토스의 서비스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토스는 국내를 대표하는 여러 핀테크 서비스 중 하나지만, 토스와 완전히 같은 사업모델을 가진 곳은 없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핀다 등 서비스 부문마다 경쟁사는 있지만 토스가 현재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 영역을 다 하고 있는 곳은 없다는 이야기다. 토스의 자회사, 계열사가 18곳이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서비스만 봤을 때 토스는 인터넷은행, 증권, 보험중개, 결제대행(PG), 결제단말기, 세무, 상담(CS), 모빌리티(타다)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상장할 때는 같은 산업군에서 먼저 상장한 기업을 뜻하는 피어그룹(Peer Group)이 비교 대상이 되곤 한다. 피어그룹과의 비교를 통해 토스가 시장에서 얼만큼의 영향력이 있는지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기업가치 책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토스는 국내에서 전반적으로 유사한 피어그룹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은 다양한 사업모델을 가진 핀테크들이 상장을 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어펌홀딩스, 로빈후드 마켓츠, 페이팔 홀딩스 등이 증시에서 거래되고 있다. 피어기업들이 많은 만큼 토스는 미국에서 핀테크 산업에 대한 잠재력, 가능성 등을 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눈치다.
궁극적으로 글로벌 진출
토스의 미국 증시 상장은 궁극적으로 글로벌 진출을 고려한 것으로도 해석이 된다. 지난 2019년 토스는 베트남 진출을 한 바 있다. 베트남 버전의 ‘캐시워크’와 같은 리워드형 서비스로, 약 300만명의 월활성사용자수(MAU)를 보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 금리인상 등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토스는 그 다음 단계인 현지 금융 서비스로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외사업 특성상 꾸준히 투자를 꾸준히 지속해야 하는 만큼,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리소스를 국내에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약 2년 만에 베트남에서 철수한 바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토스는 향후 글로벌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릴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시장에 다시 한 번 토스의 송금, 결제 서비스를 들고 나갈 수 있다. 다만, 시기는 증시 상장 이후인 흑자를 냈을 때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베트남 시장을 철수한 만큼, 해외진출은 회사가 어느정도 수익이 날 때 다음 전략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