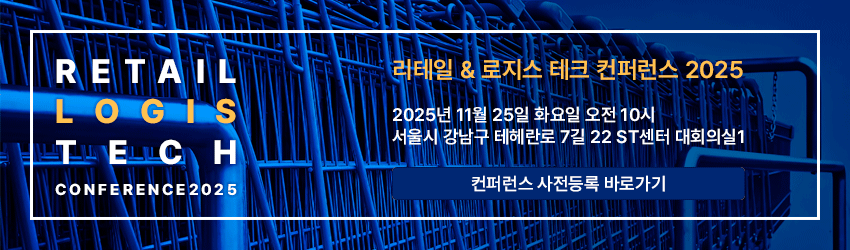“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높은 시장 점유율이 ‘독점 폐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88%에 달하는 업비트의 점유율은 ‘독과점’이 아니라 서비스, 저렴한 수수료 등의 시장 경쟁력을 토대로 한 소비자들의 선택의 결과라는 주장이다.
16일 여의도에서 열린 ‘두나무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2023’에서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점유율은 변동성이 크며, 업비트의 높은 점유율은 장점에 의거한 경쟁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업비트의 높은 점유율은 ‘장점에 의거한 경쟁’이고 만약 다른 거래소가 거래에 유리한 장점을 확보할 경우 언제든지 점유율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업비트의 높은 점유율 원인이 ▲서비스 초기 비트렉스 제휴 ▲카카오톡 연동 ▲좋은 사용자 환경(UX-UI) ▲케이뱅크와의 제휴 영향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업비트의 수수료는 0.05%로, 빗썸(0.25%), 코인원(0.2%), 코빗(0.15%), 고팍스(0,2%)로 이뤄진 원화마켓 중 가장 낮은 수수료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호황기였던 2021년 두나무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약 2110% 증가한 3조6855억원, 영업이익은 3429% 증가한 3조2727억원을 기록하며, 당시 시장점유율 1위였던 빗썸의 매출액을 넘어섰다.

크립토윈터(가상자산 겨울)에 들어서면서 두나무의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60% 이상 줄기도 했으나, 업비트의 점유율은 오히려 더 상승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업비트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은 76%였으나, 지난 2월에는 12%p 상승한 약 8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 교수는 “처음부터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지 않았던 업비트의 사례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사용자의 전환비용이 높다고 할 수 없다”며 “특정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 거래소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쉽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고착효과는 낮다”고 전했다.
임용 서울대 교수는 “2021년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60개 이상의 거래소가 한국 시장을 떠났고, 그로 인해 사업 간 수수료 경쟁 등이 치열해진 건 맞다”면서도 “이러한 경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점유율이 고착화됐다고 말하기는 애매하다”고 동의했다. 임 교수는 “현재 거래소의 점유율은 ▲거래소의 자금 유동성 ▲거래소 보안 및 안정성 ▲수수료 ▲각각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종류 및 범위 ▲마케팅 등의 경쟁 요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가상자산업 특성상 사용자가 거래소를 바꾸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지리적 범위를 국내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고히 했다. 탈중앙화라는 가상자산 특성상 거래소 가상자산의 이동이 쉽게 이뤄지는 만큼, 해외 거래소 시장까지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를 예로 들며 “업비트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내 가장 점유율이 높다고 할지라도 해외 점유율로 따지면 바이낸스의 8분의 1 수준”이라며 “해외 거래소의 국내 진출이나 국내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용을 고려하면 국내 4대 거래소만으로 사용자 고착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