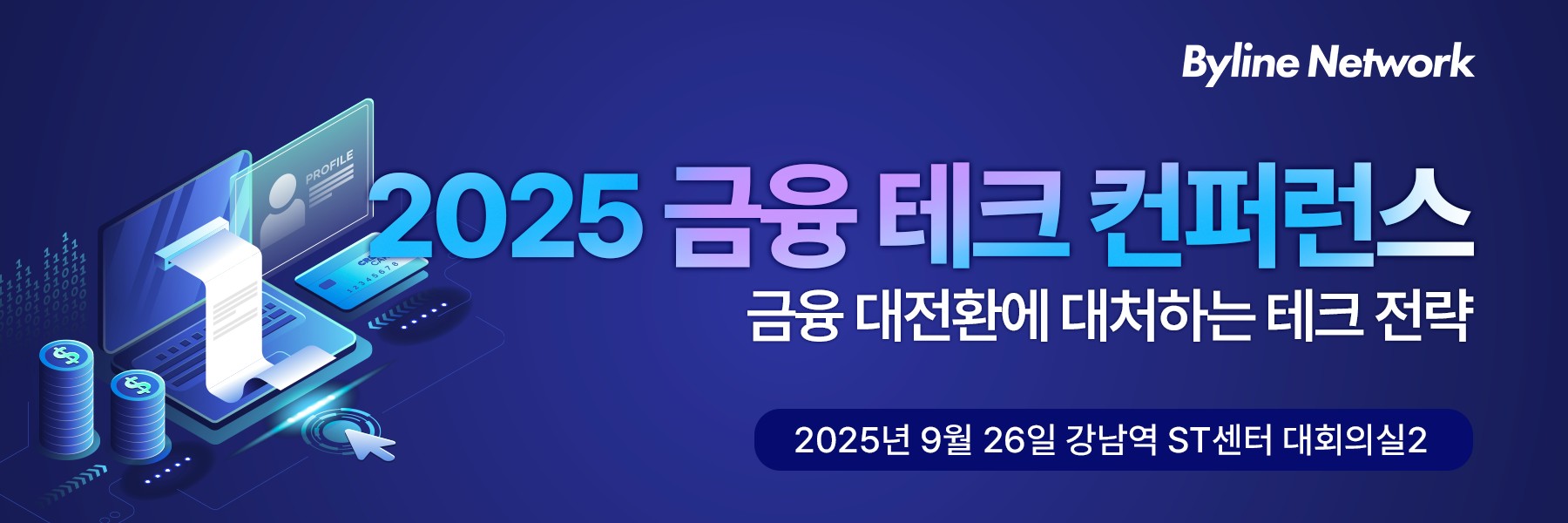[CES아시아2019] 모빌리티와 물류의 만남, 현재와 가깝고 먼 미래
모빌리티와 물류의 만남은 필연이다.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이라고 하는 ‘우버’, ‘그랩’, ‘고젝’ 등의 행보를 살펴보자.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
물론 현재 한국의 모빌리티는 ‘사람의 이동’에 초점을 맞춰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또한 경계는 무너지고 있다. 사람 타라고 만든 ‘타다’를 이삿짐을 나르는 용도로 호출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고(써 본 분에 따르면 꽤 쓸 만하다고 한다.), 이런 행보는 이미 과거와 현재의 택시에서도 관측됐던 일이다.
물론 한국법에서는 여객과 물류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건 공급자의 수급조절 관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어도, 사용자 관점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사람들은 더 큰 효용만 줄 수 있다면, 여객수단을 물류용도로 쓰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다들 그렇게 쓴다.
글로벌 모빌리티 기술이 모인 CES아시아2019에서도 ‘모빌리티와 물류’의 융합은 관측됐다. 물론 완성차 업체 16개가 등장한 이번 전시회에서도 ‘물류스러운 것’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은 덩실덩실 춤추는 차로 인포테인먼트를 구축하겠다던가, 차량을 사물과 통신하는 스마트폰으로 만들겠다던가 하는 류의 모빌리티를 하고 있었다. 아직까지 ‘여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혹은 대놓고 ‘물류’라고 이야기 하는 모빌리티 기술업체는 있었다. CES아시아2019 전시장에서 모빌리티가 물류와 만난 사례들을 찾았다. 사람과 물건의 이동이 융합되는 현재와 눈앞에 다가온 미래, 조금은 멀어 보이는 미래까지 만났다.
모빌리티의 현재 : 임모터
얼마 전 한국에서 우아한형제들 본사 지하에 사륜 전기차 ‘르노 트위지’가 주차돼 있다는 소식을 전한 적이 있었다. 이 전기차는 우아한형제들이 과거 전기차 음식배달 테스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기존 배달용 내연기관 오토바이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참고 콘텐츠: 우아한형제들 본사 지하에 민트색 전기차가 주차돼 있는 이유]
그 이유 중 하나가 ‘충전’ 문제였다. 르노 트위지는 완충시 55km를 달릴 수 있는 모델이다. 그 말인즉 배달기사가 점심, 저녁 등 주문 피크타임 주행 중 배터리가 방전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달기사는 배터리가 방전되면 한창 주문이 터져 나와 돈을 벌어야 하는 시간에 어떻게든 충전소를 찾거나 집에 가서 콘센트에 차량을 연결하고 ‘3시간(완충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엄청난 비효율이다.
이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중국에서 만났다. 현대차가 투자하여 한국에도 조금 알려진 업체인데, 이름이 임모터(Immotor)다. 임모터는 ‘전기 배터리 충전박스(Charging Station)’를 운영하는 업체다. 중국 전역 24개 도시에 2700개 충전박스를 설치, 운영한다.

구체적인 사용방법은 이렇다. 전기차 배송기사는 배터리가 방전될 것 같은 상황에서 임모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변에 있는 임모터 충전박스를 찾을 수 있다. 충전박스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비어있는 배터리칸이 자동으로 열린다. 그 칸에다가 충전해야 하는 배터리를 넣으면, 완충된 배터리가 들어있는 칸이 열린다. 배송기사가 전기차에 그 배터리를 넣고 가면 끝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자.

임모터 관계자에 따르면 충전박스에서 배터리를 완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 완충한 배터리로는 총 50km를 달릴 수 있다. 배송기사 입장에서 소요되는 배터리 비용은 km당 0.06위안(약 10원) 꼴이라고 한다. 임모터는 패키지 월과금(299위안, 약 5만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에도 최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들은 방전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를 화물차로 수거해서 멀티탭이 잔뜩 깔린 거점으로 가져가 충전을 하고 재배치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멋도 없고 효율성도 떨어져 보인다. 운송수단을 수거하고 충전하고 재배치하는 데 드는 비용도 꽤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다.
만약 이 공유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배달을 한다면 어떨까. 그 와중 배터리가 방전됐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배달기사는 중간에 업무를 멈추고 어떻게든 주변에 있는 공유 운송수단을 찾아 ‘환승’을 해야 할 것이다. 배달기사의 픽업과 배달은 분초를 다투는데, 이렇게 여유 부릴 시간이 없다. 여유 부리다간 음식점 사장님한테 혼나던가, 고객한테 혼나던가, 콜이 없어지던가 셋 중 하나는 경험할 것이다.
사실, 애초에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의 ‘요금’ 자체가 배달용에 적합하지는 않다. 그 요금 내고 배달하면 기사들에게 남는 것이 없다. 그래서 매스아시아와 같은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는 배달기사용 할인 요율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메쉬코리아는 매스아시아와 제휴하여 전기자전거 배달기사를 운영하는데, 배달가방에 예비배터리 하나를 넣어놓는 식으로 방전 상황에 대비한다.
이런 상황에서 임모터 같은 업체가 한국에 출동하면 어떨까.
눈앞에 다가온 모빌리티 : 인셉티오
부스값 비싸기로 유명한 CES 전시장 입구 바로 옆 자리에 거대하게 자리 잡은 2018년 4월산 중국 스타트업이 하나 있으니 인셉티오(Inceptio)다. 이 업체의 부스 크기는 바로 옆에 있는 아우디와 비슷한데, 잘은 모르겠지만 돈이 꽤나 많은 업체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찾아보니 중국 사모펀드 NIO캐피탈, 중국 모든 1선도시에서 80만대 이상의 차량을 추적하고 있는 FMS(Fleet Management System) 업체 G7, 중국 전역 280개 물류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물류기업 GLP가 인셉티오의 주주다.

인셉티오가 들고 나온 것은 ‘자율주행 화물차’다. 인셉티오는 스스로를 ‘기술’과 ‘운영’ 역량을 보유한 풀스택 자율주행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인셉티오가 트럭을 만들거나 물류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상용차업체, 물류업체와 제휴하여 풀어낸다고 한다. 예컨대 인셉티오가 CES아시아2019 전시장에 들고 온 트럭은 중국 상용차업체 시노트럭(SINOTRUK)의 화물차 브랜드 SITRAK이다.

인셉티오가 집중하는 것은 간선 화물운송(line-haul trucking logistics)에 특화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다. 중국 상하이와 미국 실리콘밸리에 R&D센터를 두고 열심히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인셉티오는 도시간 이동하는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레벨3의 부분 자율주행 기술을 레벨5 무인자율주행까지 끌어올려 ‘화물 로봇(Freight Robots)’ 군단으로 중국 전국 물류망을 구축한다고 한다.
이번에 인셉티오가 CES아시아2019에 선보인 것은 레벨3 자율주행 화물차다. 여기서 ‘레벨’이란 미국자동차공학회가 규정한 것인데, 자율주행 기술판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다. 레벨3의 경우 운전자가 조향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가 스스로 장애물을 감지하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한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스스로 높은 연비를 내는 방식으로 운전을 하고, 길이 막히는 경우 스스로 우회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인셉티오의 설명에 따르면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운전을 처음 하는 운전자를 ‘베테랑’처럼 운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인셉티오 관계자는 “인셉티오의 자율주행 기술은 밤낮으로 일하고 낮은 임금과 높은 연료값, 저단가 경쟁으로 고통 받는 화물차 기사들에게 해법을 찾아줄 것”이라며 “화물차 사고발생 비율을 낮추고, 연료 소비량을 줄이는 데 인셉티오가 활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셉티오의 자율주행차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곧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인셉티오는 CES아시아2019에서 “레벨3 자율주행 시스템을 대량 생산하고 전국적으로 유통 채널을 확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장 다가올 자율주행의 미래에는 사람과 자율주행이 공존하는 모습이 나온다. 물론 자율주행의 궁극체가 다가오면, 사람은 사라질 것이다.
모빌리티의 조금은 먼 미래 : 콘티넨탈 CUbE
독일 시장 점유율 1위, 유럽 신차 타이어 판매 1위를 자랑하는 글로벌 타이어 제조업체 콘티넨탈도 ‘모빌리티’ 전선에 합류한지 오래다. 아마 콘티넨탈은 ‘타이어 업체’라 불리는 것을 싫어할 거다. 스스로를 ‘기술업체’라 말하고 있고, 타이어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엔진 등 자동차 부품 개발에서도 잘 나간다고 평가 받는다. 앞서 인셉티오 자율주행 화물차에 붙어 있던 센서 ‘레이더(Radar)’도 콘티넨탈이 만든 것이다.
콘티넨탈이 이번 CES아시아2019에서 공개한 컨셉 중에 돋보였던 것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큐브(CUbE, Continental Urban mobility Experience)다. 콘티넨탈이 자체 개발한 타이어와 차표면재뿐만 아니라 센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브레이크 시스템부터 운행 기술까지 이 큐브에 녹아내렸다.

사실 큐브가 처음 공개된 것은 2017년 9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에서였다. 당시 큐브는 로보택시(robo-taxi)라 불렀다. 그러니까 미래 여객운송수단으로 쓰이는 자율주행 셔틀이 큐브의 전신이다. 큐브를 활용한다면 현대 도시의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 당시 콘티넨탈이 본 미래였다.
이 큐브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19에서 한 단계 진화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개념이 ‘스마트시티’까지 확장됐다. 단순히 자율주행 셔틀이 아니라, ‘도시 차량 관리’, ‘지능형 가로등’, ‘지능형 웨어러블’ 등 스마트시티 인프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처리 및 통합하는 ‘서비스형 도시 데이터(CDaaS: City Data as a Service)’ 플랫폼으로 변한 것이다.

여기에 하나 더 붙은 것이 있으니 ‘물류’다. 개념은 단순하다. 콘티넨탈의 구상에 따르면 자율주행 셔틀 ‘큐브’는 하나 또는 여러 대의 배송로봇을 운송한다. 이 배송로봇이 고객까지 라스트마일 물류를 담당한다. 조금 더 콘티넨탈의 자랑을 붙여주자면, 이미 콘티넨탈이 잘하는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자동화 기술’이 물류로봇에도 들어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타이어업체가 기술업체로, 이제는 물류업체가 되겠다고 하는 시대다.

굳이 콘티넨탈이 물류를 하게 된 배경이 있다. 무인셔틀은 분명히 사람들의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을 것이다. 주로 ‘출퇴근’ 시간에 말이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무인셔틀이 비어있는 시간이다. 그 끊어지는 시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이 있는데, 콘티넨탈은 그것을 ‘물류’로 채워 넣겠다는 것이다. 콘티넨탈 관계자는 “배송업무의 상당수는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학교를 가는 사이에 이루어진다”며 “큐브 로보택시의 유휴시간(off-peak hours)은 완벽하게 배송 업무 시간으로 치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런 개념은 비단 자율주행 시대까지 볼 필요도 없다. 한국의 카카오모빌리티 또한 택시의 피크타임인 출퇴근 시간의 중간에 펼쳐진 사람 없이 돌아다니는 ‘유휴시간’을 다른 무엇인가로 채워 넣을 계획을 짜고 있다. 그 무엇인가에는 당연히 ‘물류’도 고려되고 있다. 택시기사의 수익을 증대시켜 플랫폼 생태계를 보다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완전 자율주행까지 간다면 모빌리티의 먼 미래이지만, 자율주행을 택시 플랫폼으로 바꾸면 이건 모빌리티의 가까운 미래가 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엄지용 기자=상하이> drake@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