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와이드웹 30년, 웹은 죽었나 살았나
우리가 현재 인터넷 그 자체로 느끼고 있는 월드와이드웹(WWW, 이하 웹)이 30주년을 맞았다. 웹 이전에도 인터넷은 있었지만, 웹이 등장하고 나서야 인터넷은 기술자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정보를 주고 받는 기술로 자리매김했다.
웹은 팀 버너스 리라는 과학자가 유럽원자핵연구소(CERN)에서 일하면서 개발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당시 입자 가속기 연구에 전 세계에서 참여했는데 이들이 서로 다른 컴퓨터와 운영체제로 일을 하다보니가 소통이 불가능했다. 컴퓨터와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웹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최초의 웹브라우저 역시 1990년 팀 버너스 리가 발명했다. 처음에는 월드와이드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나중에 ‘넥서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무료 웨비나] 아이덴티티 보안 없는 보안 전략은 더 이상 안전할 수 없습니다
◎ 일시 : 2025년 7월 15일 (화) 14:00 ~ 15:30
◎ 장소 : https://bylineplus.com/archives/webinar/53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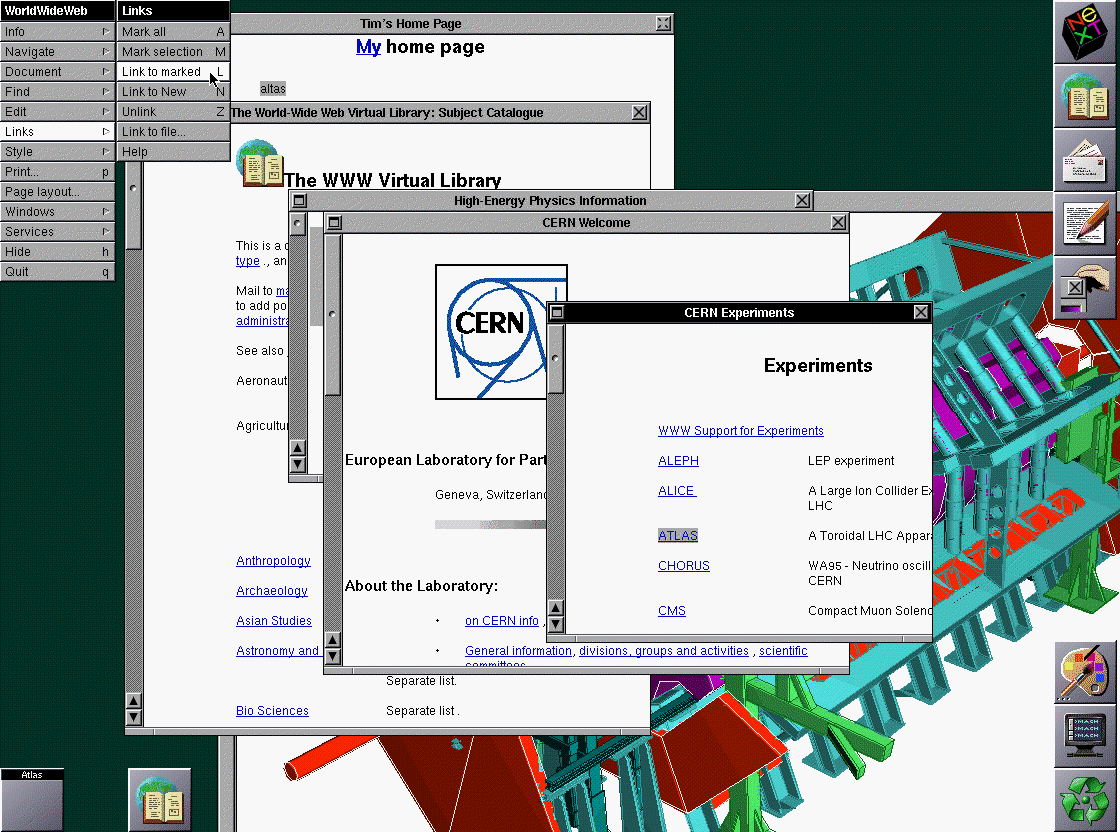
CERN은 1993년 모든 사람이 무료로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방했다. 그리고 대중적인 웹브라우저인 모자이크가 그 해 처음 등장했다.
웹이 대중적으로 활성화 되기 시작한 것은 1994년이다. 백악관의 www.whitehouse.gov가 이 때 처음 등장했다. 이해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가 세상에 선을 보였다.
1995년은 웹의 기념비적인 해인다. 웹 확산의 1등 공신 중 하나인 ‘야후’가 설립됐다. 제프 베조스도 아마존닷컴을 설립했다. CNN 등 미디어가 홈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중앙일보가 최초의 웹사이트 조인스닷컴을 만들었다.
1996년은 내가 월드와이드웹을 처음 접한 해였다.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기간 중 학교에서 열린 컴퓨터 특별강좌에서였다. 야후닷컴, 조인스닷컴, 플레이보이닷컴이 내가 처음 들어가본 사이트였다. 그리고 하이텔과의 이별을 고했다.
1997년 국내에서 한메일이 처음 등장했다. 나에게도 드디어 이메일 주소가 생겼다.
1998년은 인터넷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해다. 구글이 등장한 해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BackRub’이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구글로 이름을 바꾸었다.
네이버도 1998년에 세상에 나타났다. 네이버컴이라는 법인은 1999년 6월 설립됐다. 조만간 20년을 맞는다.

웹의 인기와 함께 닷컴버블이 생겨났다. 1999년 3월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인 5016.62를 기록했다가 거품이 터졌다. 이후 웹은 다소 침체기를 거쳤다. 투자가 위축됐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기 어려웠다.
그러다 2003년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매시라는 서비스를 하버드대학교 내에서 시작했다. 2004년에는 더페이스북이라고 이름을 바꿨고, 피터 틸의 투자를 받은 후 2005년 facebook.com이라는 도메인을 구입했다.
2005년에는 유튜브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구글은 2006년 유튜브를 인수했다. 이해 트위터가 나타났다.
2007년,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출시했다. 그러나 아직은 2G 모델이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전 세계가 허우적거리던 2008년, 3G 통신망에 대응하는 아이폰3G가 등장했고, 아이폰이 세상을 집어삼키도록 만든 3GS는 2009년에 나왔다. 그해 11월 담달폰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가상의 세계에만 존재했던 아이폰3GS가 KT를 통해 드디어 한국에 들어왔다.
그리고 모바일 혁명, BANG!
모바일 혁명 이후 웹이냐 앱이냐는 논쟁이 촉발됐다. 앱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에서는 웹브라우저를 여는 비중이 PC 시절보다 줄어들었다. 검색도 웹브라우저가 아니라 네이버 앱에서 하고, 금융업무도 각 은행의 앱에서 진행하며, 택시도 앱으로 부른다. 물론 이 앱 서비스에 웹 기술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웹브라우저로 상징되는 웹은 정체기에 들어섰다.
 미국의 IT매거진 와이어드(Wired)은 2010년 9월 커버스토리로 “웹은 죽었다”고 선언했다. 어느 정도 이 예언은 현실이 됐다. 웹브라우저로는 배달의민족에서 음식을 주문할 수 없고, 카카오택시를 부를 없다. 웹브라우저도 모바일 환경에선 하나의 앱에 불과한 지위가 됐다.
미국의 IT매거진 와이어드(Wired)은 2010년 9월 커버스토리로 “웹은 죽었다”고 선언했다. 어느 정도 이 예언은 현실이 됐다. 웹브라우저로는 배달의민족에서 음식을 주문할 수 없고, 카카오택시를 부를 없다. 웹브라우저도 모바일 환경에선 하나의 앱에 불과한 지위가 됐다.
Html 기반의 웹은 앱과 같은 사용자 경험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Html5가 등장하면서 웹에도 많은 혁신이 있었지만, 앱이 주는 경험의 수준에는 못 미쳤다.
그러나 웹이 주는 본질적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웹은 한 번만 개발하면 이용자가 어떤 운영체제를 사용하든,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하든 상관없이 접근 가능하다. 웹은 또 검색이라는 통로를 통해 이용자를 만날 수 있다. 반면 앱은 검색이 어렵고, 이용자의 환경에 따라 별도로 개발해야 한다.
최근에는 웹과 앱을 통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PWA는 웹에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수준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서비스 워커(service worker)라 불리는 기술을 통해 사용자가 오프라인이거나 불안정한 네트워크에 있어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홈스크린에 아이콘을 추가할 수도 있고, 네이티브 앱과 같은 초기화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주소창이 없는 전체 화면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단지 진화할 뿐.
PS. 웹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빼먹었다. 2015년 11월, 바이라인네트워크가 첫 기사를 세상에 내보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