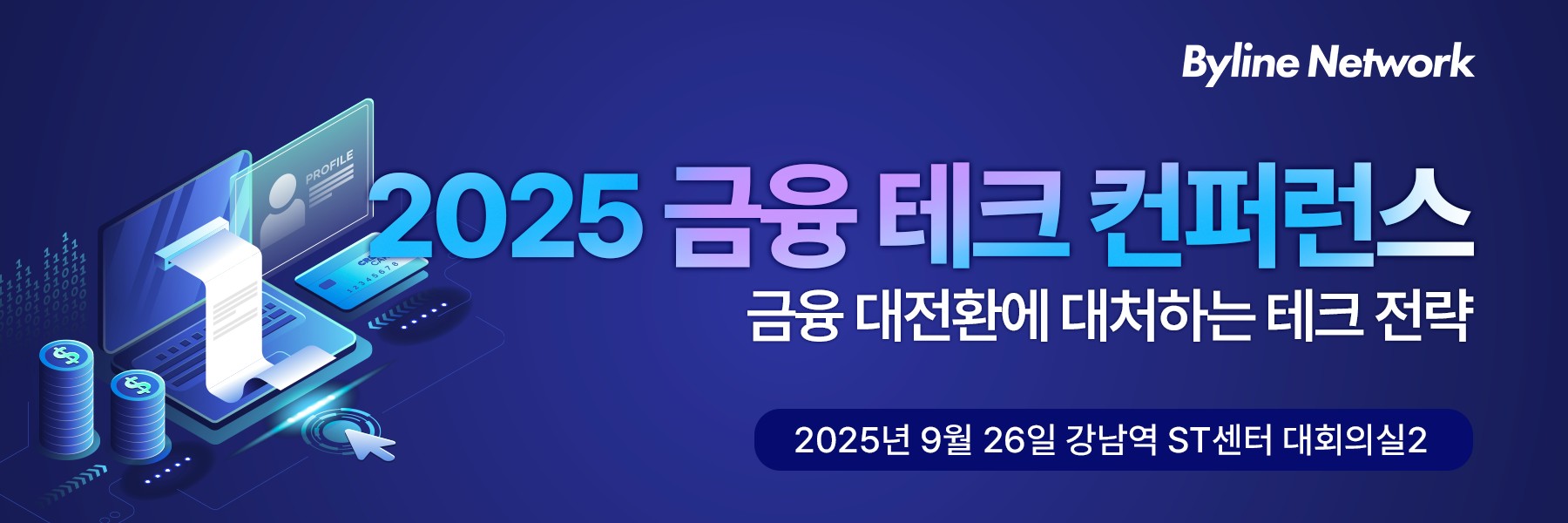제주가 스타트업의 ‘포스트 대만’이 될 수 있을까
“대만이 중국과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였다면, 이제는 제주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섬’은 더 이상 갇힌 곳이 아니다. 대만은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을 십분 활용, 동서양 무역의 거점이 됐다. 제주라고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역사상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이만큼 세계인의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나. 지금의 상황을 잘만 활용하면, 제주도 대만이나 싱가포르 못지 않은 ‘네트워크의 요충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10일 제주 드림타워에서열린 ‘컴업 인 제주’ 기조 대담에서 제주를 ‘아시아 스타트업 생태계의 허브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랜드 차이나 EIV 김남국 총경리는 이 자리에서 “중국 기업들은 해외 진출 시 대만 교포 네트워크를 활용했고, 일본 기업들 역시 대만을 거쳐 대륙으로 들어왔다”며 “이 구조를 제주로 옮겨올 수 있다면 아시아 스타트업 생태계의 허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랜드 차이나 EIV는 한국 이랜드의 중국 사업부다. 1992년에 중국에서 의류 생산을 시작했고, 2001년에 본격적으로 브랜드 리테일을 시작했다. 지금은 중국 전역에 12개 지사, 2000여개 오프라인 직영 매장을 운영한다.
김남국 총경리는 특히 제주가 ‘2박 3일’ 관광지가 아닌, ‘1개월 체류형 거점’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관점에서, 중국 시니어 세대를 주목하라고도 조언했다. 그는 “60년대생 개혁개방 세대는 부를 축적했지만 해외 이민보다는 본토에 머물며 장기 체류형 관광을 선호한다”며 “장기 체류가 늘어나면 부동산, 모빌리티, 핀테크, 교육까지 새로운 수요가 생긴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함께 대담에 나선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제주는 상주 인구는 60만 명이지만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다”면서 “노선버스와 관광버스를 구분할 필요 없는 ‘관광+생활 교통’이 공존하는 구조를 설계한다면 모빌리티 산업 기회가 무궁무진하다”고 제주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제주를 협업의 무대로 삼으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서로의 차이와 공통 과제를 인식하고 협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상우 의장은 “한·중·일은 사실상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며 스타트업 네트워킹과 교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과거 미디어가 만든 왜곡된 정체성이 사라지고, 오히려 교류가 늘면서 서로 호감이 커졌다”며 “스타트업들이 국경을 넘어 협력한다면 관광·문화·로컬 산업까지 시너지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규 제트벤처캐피탈 총괄 파트너는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소멸 등 한·중·일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를 스타트업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효율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 제트벤처캐피탈은 라인과 야후가 합병해 만든 LY주식회사의 CVC(기업이 만든 벤처캐피탈)다. 일본 내 최대 규모 CVC로 꼽히며, 한국과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임은규 파트너는 “일본도 투자 받은 스타트업의 숫자를 기준으로, 도쿄 집중도가 66%에 달할 만큼 (수도) 편중이 크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여러 주체가 효율성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임 파트너는 “일본의 경우 지방마다 좋은 학교가 고루 퍼져 있고, 지방 정부도 많이 개발되어 있으며 은행도 지방이지만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가져 지방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학교와 지방 정부, 은행이라는 세 카테고리의 주도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김남국 총경리도 “중국 서부 개발 사례처럼 정부·대기업·스타트업의 협업이 새로운 성장을 만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담의 사회를 맡은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는 “한중일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를 제주에서 풀어낸다면, 곧 세 나라 모두의 기회가 된다”며 “제주가 동아시아 스타트업 협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세 사람의 발언을 정리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김남국 총경리와 임은규 파트너가 자신들이 그간 겪어온 중국과 일본의 최근 분위기를 소개하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소통방식’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임은규 파트너는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의 변화를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일본은 억지로 디지털화를 받아들이며 B2B뿐 아니라 B2C 시장까지 빠르게 확장됐다”며 “창업자와 투자자들의 태도 역시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고유의 ‘역할 중심 문화’로 인해 한국식의 빠른 실행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임 파트너는 “일본 직원들은 주어진 롤과 프로세스를 중시한다”면서 “스타트업식의 무한한 ‘롤 확장’을 요구하면 오히려 반발심을 일으켜 파트너십이 깨질 수 있다”고 현지화된 접근을 강조했다
김남국 총경리는 중국 시장의 핵심 요인으로 창업자의 의지, 본업의 체력, 현지화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해외 사업은 본국 대비 두 배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창업자가 직접 현장을 챙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무용지물”이라고 했다
중국 시장 특유의 소통 방식도 강조됐다. 그는 “언어 소통을 넘어 소비자 트렌드 이해, 정부 정책과 리스크 관리까지 포괄하는 정무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수”라며, 상하이와 북경 같은 ‘표준화된 대도시’에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컴업 인 제주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관광 분야 투자사와 스타트업, 지원기관을 한데 모아 서로 간의 협업을 끌어내기 위해 기획됐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