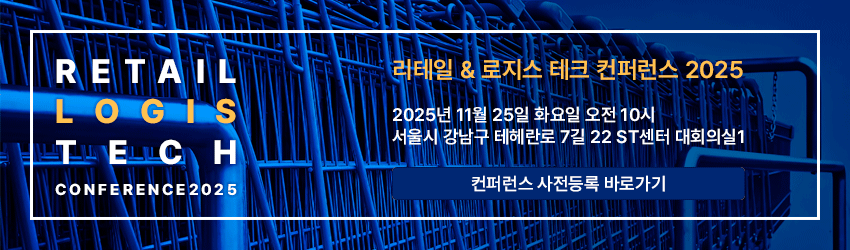“정부가 모태펀드 퍼붓는데, 왜 시장에선 돈이 없다고 느낄까?”
“2020년 이후, 정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모태펀드를 만들어 (돈을) 퍼붓는데도 벤처 현장, 초기 기업에서는 돈이 없다고 아우성일까요?”
3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주최한 ‘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영근 상명대학교 교수는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메커니즘을 강조했다. 정부가 마중물을 아무리 부어도, 민간에서 크게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벤처가 활성화 되긴 어렵다. 최영근 교수 말의 요지는, 민간이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인데, 그게 ‘회수 시장’의 활성화다.
최 교수는 “‘벤처기업–벤처캐피탈–회수시장(코스닥)’이라는 세 바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하고, 이 중에서도 회수시장이 살아 있어야 투자도 활발해진다”고 지적했다. 그 대표적 회수 시장이 코스닥이다. 그런데 최 교수는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의 2부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의 자발적 경쟁력 제고 노력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미국의 나스닥처럼, 코스닥 역시 독자성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코스닥의 지배구조 개선, 즉 거래소 내 2부 리그가 아닌 독립적이고 모험적 자본시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코스닥을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고, 상장 문턱은 낮추되 상장 유지 요건은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장 주관사에 대한 책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일본 시장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코스닥으로 가려는 벤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다뤘다. 특히, 기술특례상장을 한 기업이 결과적으로 재무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지 않느냐는 우려가 현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기술특례상장한 기업들의 경우 초반에는 R&D 등의 투자로 재무성과는 낮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위 10% 안에 드는 기업들의 경우 일반 상장 보다 오히려 특례상장한 회사들의 주식 가치가 훨씬 많이 커졌다는 이야기다.
이석훈 연구위원은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이 상장 후 5년~7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가총액이 성장하는 특징이 있다”며 “단기 실적에 집착하기보다는 기술과 시장성,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시를 통한 투자자 보호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성장기업 시장 사례를 비교하며, 상장 진입 문턱은 낮추되 상장 후의 엄격한 생존경쟁,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해가는 글로벌 트렌드를 소개하기도 했다.
현장 토론에서도 코스닥 회수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책이 집중 논의됐다. 전화성 한국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장은 “엑셀러레이터 업계는 투자와 보육을 병행하지만, 코스닥 상장 문턱은 여전히 높고, 회수시장이 막혀 있어 성장의 선순환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팁스(TIPS) 프로그램 등 정책의 연계와 인센티브, 엑셀러레이터의 첫 상장 사례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상준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대표도 “국내 벤처캐피탈 펀드의 연간 투자 규모는 12조원이지만 회수는 5조원 미만”이라며, 회수시장 정체가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락업(보호예수) 제도 등 관행의 유연한 개선과, 벤처캐피탈이 IPO 이후에도 성장 기업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
토론에서는 코스닥의 플랫폼 역할 강화, 규제 완화와 투자자 선택권 확대, 기관투자자 중심의 시장 유도, 정책자금 선순환 구조 구축 등이 지속 언급됐다. “경직된 사전 규제보다는, 시장에서 선택받는 기업이 더 성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코스닥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투자자들이 해외(서학)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코스닥의 자율성과 경쟁력 회복, 투자자 중심 플랫폼 전환을 주문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